최근 글 목록
-
- [기고]
- 2015
-
- [펌] 노동자 시인 박영근 추모글
- 2014
-
- 11월
- 2013
-
- 10월의 끝
- 2013
-
- 시월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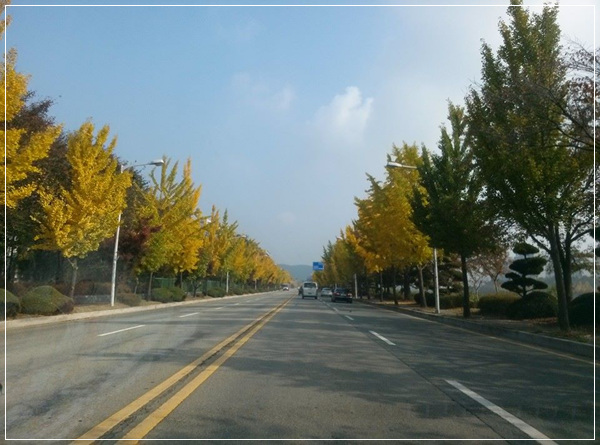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예년 같으면 벌써 은행잎들이 다 떨어졌을 때인데.... 그런 기억을 더듬으며 썼다.
<11월>
오늘도
반팔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팔로 나다닐 거냐고
누군가 놀려대기에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 가을이 끝난다고 했다.
10월 하순이면
연구단지 가로수들은 일제히 옷을 벗고
샛노란 은행잎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난 은행나무들은
여지껏 녹색을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팔은 내 탓이 아니다.
봄 가을은 슬그머니 사라져 가고
올해 겨울은 기세가 더 꺾일 것이다.
사과나무 북방한계선이 휴전선 넘어가면
겨울에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1월의 내 반팔보다 그게 끔찍하다.
농반진반으로 너스레를 떨어 보지만
세월이 흘러도 풀기 어려운 문제는 쌓여만 간다.
고공, 천막, 노숙, 심지어 고압 송전탑까지
사시사철 그칠 줄 모르고
죽지 말자 함께 살자 외치는 목소리.
아우성쳐도 저들은 들은 척 하지도 않고
기세 꺾인 겨울일망정
자주 한계를 넘나드는 고통이다.
법치보다는 감시와 폭력,
공존보다는 증오와 배제,
불감증을 일상화하는 뉴스와 댓거리들,
그 사이 어딘가쯤에서
분노와 무력감 사이를
온탕과 냉탕처럼 오가다 보니
반팔은 사치이고 허영인 듯 자꾸 맘이 쓰인다.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 따스해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드러낸 살갗에 와닿는 싸늘한 공기와 바람이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조용히 일깨워 주곤 한다.
(2013. 11. 4)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