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님의 [채식 고민 다시 하기] 에 관련된 글. 채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내 식생활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보니 어릴때는 음식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게 뭔지, 이것만 먹어야 되는지, 안먹으면 안되는지.. 이런걸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없죠. 먹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젓가락 가는대로만 먹으면 으레 눈총, 꾸중이 날아오게 마련이고, 심각한 경우는 어른들끼리 화내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_-
특히 가난하게 자라고, 몸도 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음식은 주어진 대로, 거르지 말고 남김 없이 모두 "먹어 치워야"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아주 좋죠. 환경에도 좋고, 음식 만드신 분에게 보람도 드릴 수 있겠고.. 몸에, 입맛에 맞다면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음식이 입과 몸에 맞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도 음식 소개 다니며 갖가지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의심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 괜찮을까... 그때 옆에서 함께 보는 사람들은 입맛 다시고 난리도 아니지만)
저는 해물을 싫어하는데, 어디 놀러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해물하면 환장하고 즐기는 걸 종종 겪습니다. 난 왜 해물을 싫어할까.. 물컹한 느낌? 비린내? 물론 그렇긴 한데, 물컹한 느낌이 있고 냄새가 나긴 해도 어릴때 먹어본 적이 있거나 "대중적(?)"인 것들은 또 못먹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해물을 싫어한다고 했더니 어릴때 가난하게 살았ㅤㄴㅑㅂ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더군요. 바닷가에 살지도 않고 자주 놀러가지도 않으며 약간이라도 더 비싼 해물을 어릴때 못 먹어본 사람은 계속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누가 왜 해물 싫어하냐고 하면 어릴때 안 먹어버릇해서 그런가보다 합니다. 하지만 제일 싫어하게 된 계기는 산낙지.. 죽은거나 산거나 고기는 마찬가지라고, 죽은것은 먹고 산것은 못 먹는거는 위선일 뿐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하여간 살아 꿈틀대는 낙지를 통째로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고는 서로 맛있다고 환장하는 모습을 볼때.. 쏠리더군요. 욱. 또 최근에 게 요리를 사람들이 맛나게 먹고 감동(?)하는 걸 티비에서 봤는데 게 껍질을 벗겨 숫가락으로 벅벅 긁어 먹고 후루룩 짭짭하며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심하게 거북했습니다. 외형이 그냥 남아 있는 걸 파먹는걸 봐서 그렇다는, 결국엔 같은 위선인 걸까요.
그래서 어쩌다 바다로 놀러가게 되면 내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 뭘 먹지? -_- 입니다. 된장찌개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밥을 다 먹습니다
그렇게 보면 식생활, 식습관이라는 건 어릴때 어른들에 의해 주입된, 주변 환경과 맞물려 자신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먹던대로 계속 먹으며 난 이걸 좋아하나보다.. 고 하지만 사실은 별 생각없이 되는 대로 먹는거죠. 특히 요즘 들어 점점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해지고 먹는 종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때 잘 먹던것도 지금은 생각만 해도 거부감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면서 "뭐든지, (일단)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줄어들어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먹는 육식이란 정말 흔히 "대중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부분집합입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소고기는 어느 부위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닭은 맥주 안주로 치킨은 잘 먹지만 닭도리탕을 한다거나 하면 점점 잘 안먹고 감자만 골라 먹습니다. 고기를 아예 안 먹는것이 아니라서 "채식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뭐건 점점 채식에 대한 선호는 커져가고는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일단 시작하면" 걱정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채식도 종류가 아주 많다고 하고.. 단계별로 서서히 범위를 좁혀가면 될려나요. 글쎄요. 평소에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아서 뭐라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선택권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포스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흠. 만일 시스템이 육식을 하게끔 유도하지 않고, 어릴때부터 자유롭게 음식 주기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육식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거나 하는 경향이 줄지 않을까.. 에구. 잘 모르겠삼.

KLDP (리눅스 문서 한글화 프로젝트) 가 96년에 시작했으니 지각생에겐 "눈팅 8년"입니다. KLDP가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에는 기술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사회 이슈, 사람 사는 이야기등 다양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 웹브라우저 시작페이지는 http://kldp.org 였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주소창에 저 주소를 입력했고, 한번 들어가면 몇시간 동안 머물다 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리눅스만 붙잡고 지내기 보단 돌아다니며 사람만나는 걸 위주로 활동을 하다보니 KLDP도 좀 덜 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리눅스, F/OSS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역사인 KLDP의 10주년 기념은 제게도 기념할 만한 날이죠. (눈팅만 주로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뜨거운 관심을 보여줘서 섹션마다 와글와글했습니다 :) 총 3개의 섹션으로 강의가 구성됐습니다. 기술섹션, F/OSS섹션, 비즈니스 섹션. 강호의 고수들이 KLDP 10주년을 맞아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벼룩시장, 물물교환 장터도 열렸습니다. Warpdory 라는 분이 가져오신 레어 아이템(희귀한 물건)들. 저용량 하드(한때는 경이의 대상이었을 것이나), 구닥다리 장비, 추억의 OS와 책들.. 주고 싶은 만큼 주고 가져갈 수 있었고, 자신이 가져온 것과 교환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게 있으니 행사장 분위기에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특히 이쪽 사람들의 감성과 추억을 자극하는 것들이죠.
 휴식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약간 추운 실내를 순식간에 덥게 만드는 열정들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거고, 온라인에서만, 별명으로만 알던 사람들의 실체(?)를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묘한 기분이란.. 푸훗
휴식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약간 추운 실내를 순식간에 덥게 만드는 열정들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거고, 온라인에서만, 별명으로만 알던 사람들의 실체(?)를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묘한 기분이란.. 푸훗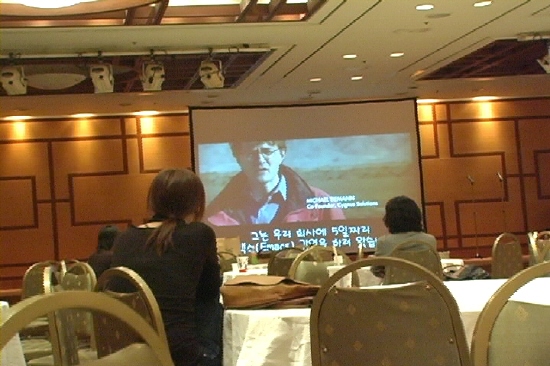
다른 방에서는 "Revolution OS"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몇년 된 건데, F/OSS 를 만들어 온 사람들과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리차드 스톨만, 리누스 토발즈, 에릭 레이먼드 등 경이(?)의 대상들을 즐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랫만에 F/OSS 를 처음 알았을때의 감동과 흥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계속 흐르고, 기대했던 혁명(?)은 늦춰지거나, 혹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사회운동진영과 F/OSS 가 행복하게 만나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상상과 기대를 갖고 다시금 스스로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












 또 한번 엄청난 노동력을 선보인 makker, 이사가 거진 끝나갈 때쯤 TV를 보며 쉬고 있군요.
또 한번 엄청난 노동력을 선보인 makker, 이사가 거진 끝나갈 때쯤 TV를 보며 쉬고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