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노동자의 책읽기와 노동자의 책 만들기 ②
노동자 문화정치로서의 노동자 글쓰기
연재 방향을 정하느라 둘째 글이 늦어졌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도 두서없이 출발하니 이렇게 낭패를 본다. “앞으로의 세상이 노동자의 책으로 지배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 책 이야기에 앞서 글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흔하디흔한 글쓰기 말이다. 글쓰기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한다. 애, 어른 가리지 않는다. 교육의 근본이자 사회생활 하는 데 필수요소다. 요즘은 모든 게 자못 글쓰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다. 아니, 사람은 글쓰기로부터 출발한다! 시나브로 존재의 증명이 글이 된 것이다. 그러니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책의 바탕이 되는 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과연 노동자의 글쓰기는 어떤가? 노동자들에게도 글쓰기가 중요하고도 중요했다. 착취와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알려내기 위해, 그리고 고단한 삶을 갈무리하기 위해. 그러나 지금은 책으로 유명해진 노동자들은 있을지언정 일상적으로 글을 쓰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다. 풍물패나 노래패가 사라진 게 당연하듯 노동자문학회가 사라진 것도 당연해져 버린 세상이다. 소모임은 투쟁의 산물이던가. 열정과 신념이 사라지니 사측이 장악한 동호회 말고는 버티기 힘들다.

이제 노동자들이 쓴 글을 만나는 건 쉽사리 <작은책>에서나 가능하다.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살아가는 이야기’와 ‘일터 이야기’는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성에 안 찬다. 안건모 발행인과 독자의 논쟁도 그렇거니와 문제는 결국 ‘정치’ 아닌가? “작가는 그 시대의 산소다”라는 주장(권력)에서 걸림돌이 된 건 표현(폭력)의 문제였다. <작은책>에서 벌어진 ‘작은 논쟁’은 권력과 폭력의 동일시라는 흥미로운 주제려니와 본질과 현상이라는 문제에 다가갈 수 있어 노동자의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미끼를 던져준다. 그리고 난 이걸 소통(재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자 문화정치’로 들여다보고 싶다. 우리에게 그냥 일상은 없다.
일상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재생산이 작동되는 시공간이다. 그러므로 일상은 이데올로기가 작동된 효과다. 일상이란 습관적인 행위와 관습적인 규범들로 구성되므로 우리들의 신체에는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여러 관행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권력도 폭력도 모두 이 안에 있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재생산과정으로서의 일상은 노동자를 ‘이미 그리고 항상 주체로’ 구성한다. ‘일상’은 노동자의 삶이 재생산되는 ‘주체화’의 공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과 폭력이 작동되는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 나아가 미학의 문제로 논쟁의 제2라운드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책> 일꾼들에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 글의 소재로 <작은책>을 빌려 쓴 점 이해 바란다. 발행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감 없이 지면에 싣는 <작은책>의 열린 자세가 노동자 문화정치의 자극적인 재현이 아닐까 싶다.)
해연海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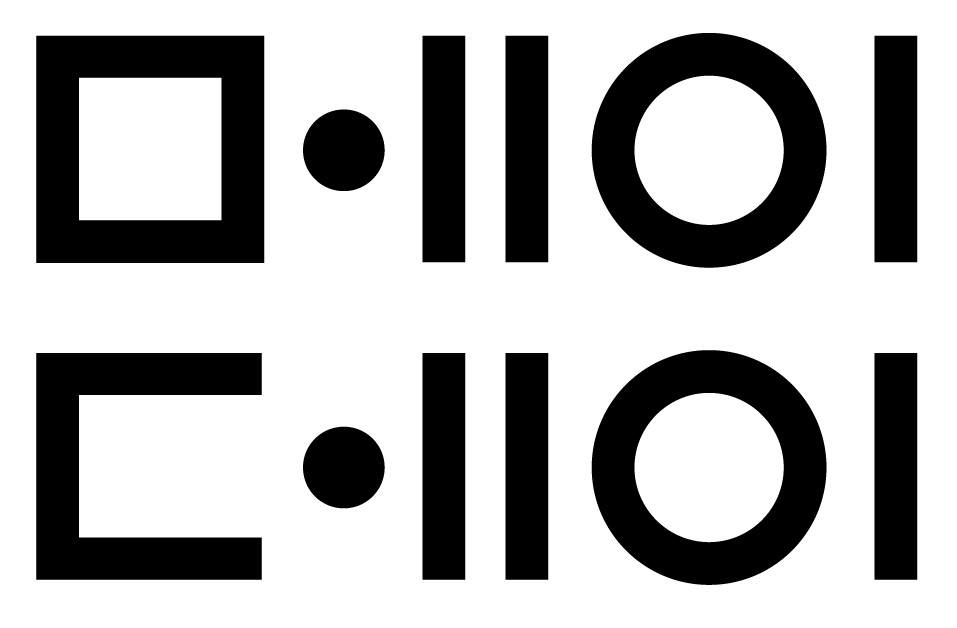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