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혁신의 진통 딛고 희망으로 부활하나 |
| 21세기 한국의 마르크시즘 재조명 활발 |
|
|
|
안철흥 기자 epigon@sisapress.com |
|
|
|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21세기 한국에 마르크스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지난 5월 말 세계적 규모의 마르크스주의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계간 <역사비평>(2005년 여름호)은 ‘다시 사회구성체 논쟁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특집을 싣고, 마르크스적 문제 의식의 복원을 시도했다.사회주의가 몰락한 지 10년이 훨씬 지난 뒤다.우파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옛 좌파마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어 다는 시대에 벌어진 일들이다.
지난 5월29일 낮, 김수행(서울대·경제학) 김세균(서울대·정치학) 강내희(중앙대·영문학) 손호철(서강대·정치학) 교수 등 좌파 학자들이 서울 건국대 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야운동가 백기완씨,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보였다.이 날부터 이틀간 열린 ‘맑스 코뮤날레’에는 2백명이 넘는 국내외 학자와 일선 연구자들이 참가했고, 이틀 동안 논문 40여 편이 발표되었다.‘맑스, 왜 희망인가?’ 이 날 모인 이들이 벌인 토론 주제다. 코뮤날레는 코뮤니티와 비엔날레를 합쳐서 만든 말. 이번 대회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지난 대회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10여년 만에 만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토로하고 해후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문제 의식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한 성격의 대회였다. 이번 대회의 최대 화두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이른바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모아져,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뉴레프트’ 성향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노동·화폐의 동일성과 차이라는 철학 개념의 해석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은 대중이 공유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였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진지했다.
<동자동 처자 왈, 유료회원제 탓으로 전체기사를 링크할 수 없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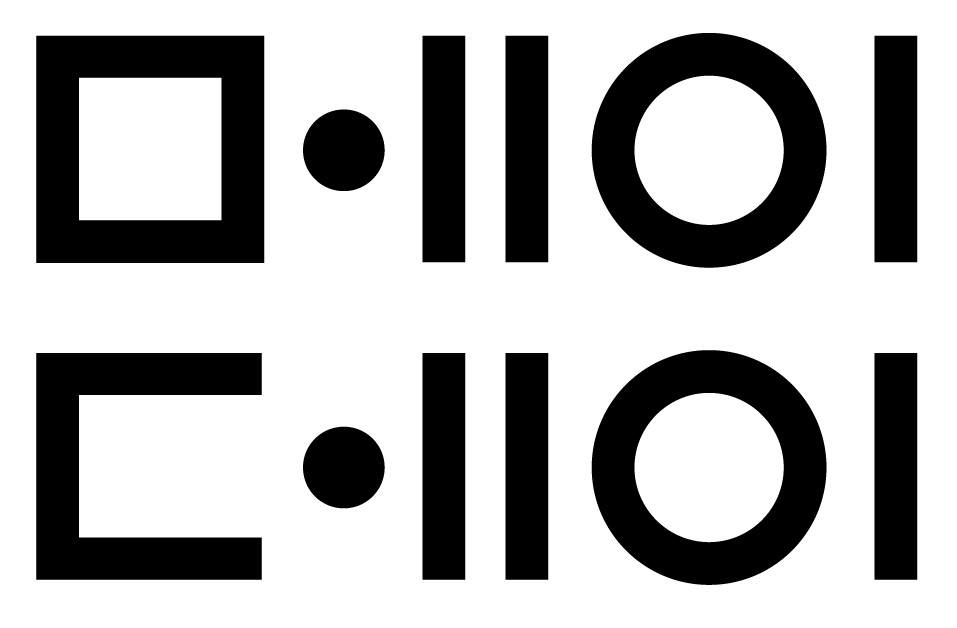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