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을 걸어온 이야기-"그릇을 비우고 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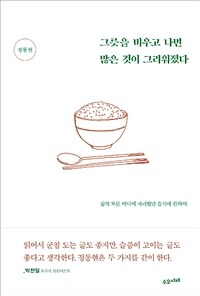 |
| 그릇을 비우고 나면 많은 것이 그리워졌다 - 삶의 모든 마디에 자리했던 음식에 관하여 정동현 수오서재, 2019 |
맨날 뭐 세계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딱딱하게 써낸 글들만 보는 시절이 있었다. 아, "있었다"라는 과거형 표현은 어색하다.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꽤 장시간을 딱딱한 글만 본데다가 논문이니 보고서니 하는 딱딱한 글만 쓰다보니 뇌가 경화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에세이 쓰는 수업 몇 시간을 들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다른 건 모르겠고, 수업시간에 다른 수강생들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다. 세상엔 나 말고, 그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무슨 얼어죽을 변혁이니 진보니 떠들어댔는지 쑥쓰럽기까지 하다.
아무튼 그러다보니 수필들을 몇 편 일게 되었고, 아예 그런 류의 책들을 보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 "그릇을 비우고 나면 많은 것이 그리워졌다"는 책이다. 지은이가 여러 경로를 거쳐 요리의 세계에 들어갔고, 지금도 요리관련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 둘 풀어놓은 게 이 책이다. 먹는 거 관련된 책들을 근간에 몇 편 봤는데 그 중에서도 꽤 재밌는 책이었다.
유튜브 보면 왜 그런 거 하잖나. 먹방. 먹방도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많이 먹는 것을 주제로 한 먹방이 있는가 하면,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먹방, 혼자 먹는 먹방, 여럿이 먹는 먹방, 집에서 먹는 먹방, 음식점 찾아다니는 먹방, 야외에서 먹는 먹방, 생존먹방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음식에 관한 책도 마찬가지다. 유형을 일일이 들이밀기도 벅차다. 손가락 아플 정도니 생략하자.
어쨌거나 이 책도 먹방이라면 먹방이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담뿍 담겼다. 그런데 단지 먹는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각 글의 제목만 봐도 글이 어떻게 쓰일지 대충 감이 올 정도다. 우선 대상이 되는 음식이 있다. 통닭이면 통닭, 냉면이면 냉면.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소재가 있다. 예를 들면, "어디론가 떠날 때면, 우동(126쪽)" 이런 식으로 글 제목이 붙어 있다. 내용은 그렇다. 우동이라는 음식이 등장한다. 그 우동에 얽힌 추억 한 자락이 꽂힌다. 그 추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동 같으면 한국 어디에서 먹은 우동, 일본 어디에서 먹은 우동 등 몇몇 추임새가 끼어든다.
일본 먹방 드라마인 '고독한 미식가'를 보면 그 패턴은 지루할 정도로 뻔하다. 고로는 업무차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혹은 약간은 다른 어떤 관계를 풀기 위해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주된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갑자기 공복감을 느끼고, 음식점을 찾자고 자신에게 명령한 후 골목 여기저기를 누비다가 어떤 음식점에 필이 꽂히면 거기 들어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메뉴를 정한 후 이를 즐긴다. '고독한 미식가'의 패턴은 이 틀거리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틀이 익숙하고 재밌다. 그 틀 안에는 꼭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은 맛있게 보이며 그 음식을 고로는 맛있게 먹는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먹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된다.
이 책도 마찬가지. 뻔하다. 저자가 퍽이나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다보니 그가 각 음식에 대해 느꼈던 서정에 거의 대부분 동화될 지경이다.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한번쯤은 느껴봤을 서정들, 그 서정들과 결합된 음식들. 그러다보니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낯설지 않고, 읽다보면 나의 옛날이 생각나게 된다. 물론 가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생각나게 만드는 부분마저 있어 난처하기도 했지만 그건 뭐 잠깐이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무슨 '고생배틀'하듯 지가 제일 고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난 나의 과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보이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고생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싫기에 고생배틀 시작되었다싶으면 그냥 거기서 일어서든지 자르든지 하는 식이다. 만일 이 책이 음식에 얽힌 고생담을 통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컸는지 아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그냥 안 사고 말았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차분하게,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과 그에 얽힌 추억을 들려준다.
아, 글 올리다보니 배고파졌다. 얼른 올리고 밥부터 먹어야겠다.
고로 식으로 하자면 "はらがへった!"라는 자각 후 "みせをさがそ!"라며 요깃거리를 찾아 헤메기 시작할 때의 느낌이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