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준의 시 세 편
최영미 시인이 쓴 산문집을 보다가 그가 박남준 시인이 낸 시집의 발문을 쓴 것을 알았다.
박남준의 시가 가끔씩은 와닿을 때가 있다.
누군가는 산으로 가고 싶다면 그의 시집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만하다.
거기에서 시 세편을 담아온다.
마지막 시는 고정화된 성별분업에 입각해서 썼다고 말이 나올 수 있겠네.
박남준.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창비. 1995.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나 오래 침엽의 숲에 있었다.
건드리기만 해도 감각이 곤두세운 숲의 긴장이 비명을 지르며 전해오고는 했지. 욕망이 다한 폐허를 택해 숲의 입구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시절을 생각한다. 한 때 나의 유년을 비상했던 새는 아직 멀리 묻어둘 수 없어서 가슴 어디께의 빈 무덤으로 잊지 않았는데
숲을 헤매는 동안 지상의 슬픈 언어들과 함께 잔인한 비밀은 늘어만 갔지. 우울한 시간이 일상을 차지했고 빛으로 나아가던 옛날을 스스로 가두었으므로 이끼들은, 숨어 살아가는 것이라 여겼다.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포자의 눈물 같은 습막을 두르고 숲의 어둠을 떠다니고 있다.
가슴에 병이 깊으면
먼산은 언제나 길 밖의 발길로 떠돌았으므로 상여처럼 돌아가는 길가,
등뼈 깊이 봄날이 사무쳐서 어지러운데, 두 눈에 장막은 일어 몸,
휘청이는데 얼마 만인가 마당 가득 풀들은 어느새 저토록 자라났는지,
나 먼 길 떠나고 사람 손길 닿지 않으면 이내 저 풀들,
어두운 내 방 방구들에도 솟아나겠지.
풀을 뽑는다.
한 포기의 풀을 뽑는 일도 마음대로 쉽지 않아서
모질게 다져먹지 않고는 손댈 수 없다.
쇠별꽃 봄맞이꽃 꽃마리 개미자리, 서럽다. 꽃들이 피어난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조금 크고
어떤 것은, 보기에도 안쓰러우리만큼 작고 깨알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눈물나지 않은 것 없어 이 짓이 뭐람, 이 짓이 뭐야,
한 움큼 뽑았던 풀들 놓아 버리고
주저앉아 마음 처연한데, 앞숲인지 들려오는 너 두견,
울부짖느냐 무너져내리는 새소리.
꿈같은 꿈같은
일터에서 돌아오는 낭군을 위해 들녘에 나가 나물을
캐고 봄쑥이며 냉이 씀바귀 나물무침이며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이고 불을 때어 저녁밥
을 짓고 아! 그런 다소곳하고도 아미 고운 조선색시
다시는 없겠지요.
가르마 같은 논밭길을 걸어오며 모락모락 멀리 밥짓는
저녁 연기 바라보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씻은 듯
털어내며 가슴 뿌듯한 행복으로 발걸음 재촉하는 그런
그런 눈매 선한 조선 사내도 다시는 다시는 없겠지요.
박남준의 시가 가끔씩은 와닿을 때가 있다.
누군가는 산으로 가고 싶다면 그의 시집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만하다.
거기에서 시 세편을 담아온다.
마지막 시는 고정화된 성별분업에 입각해서 썼다고 말이 나올 수 있겠네.
박남준.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창비. 1995.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나 오래 침엽의 숲에 있었다.
건드리기만 해도 감각이 곤두세운 숲의 긴장이 비명을 지르며 전해오고는 했지. 욕망이 다한 폐허를 택해 숲의 입구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시절을 생각한다. 한 때 나의 유년을 비상했던 새는 아직 멀리 묻어둘 수 없어서 가슴 어디께의 빈 무덤으로 잊지 않았는데
숲을 헤매는 동안 지상의 슬픈 언어들과 함께 잔인한 비밀은 늘어만 갔지. 우울한 시간이 일상을 차지했고 빛으로 나아가던 옛날을 스스로 가두었으므로 이끼들은, 숨어 살아가는 것이라 여겼다.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포자의 눈물 같은 습막을 두르고 숲의 어둠을 떠다니고 있다.
가슴에 병이 깊으면
먼산은 언제나 길 밖의 발길로 떠돌았으므로 상여처럼 돌아가는 길가,
등뼈 깊이 봄날이 사무쳐서 어지러운데, 두 눈에 장막은 일어 몸,
휘청이는데 얼마 만인가 마당 가득 풀들은 어느새 저토록 자라났는지,
나 먼 길 떠나고 사람 손길 닿지 않으면 이내 저 풀들,
어두운 내 방 방구들에도 솟아나겠지.
풀을 뽑는다.
한 포기의 풀을 뽑는 일도 마음대로 쉽지 않아서
모질게 다져먹지 않고는 손댈 수 없다.
쇠별꽃 봄맞이꽃 꽃마리 개미자리, 서럽다. 꽃들이 피어난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조금 크고
어떤 것은, 보기에도 안쓰러우리만큼 작고 깨알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눈물나지 않은 것 없어 이 짓이 뭐람, 이 짓이 뭐야,
한 움큼 뽑았던 풀들 놓아 버리고
주저앉아 마음 처연한데, 앞숲인지 들려오는 너 두견,
울부짖느냐 무너져내리는 새소리.
꿈같은 꿈같은
일터에서 돌아오는 낭군을 위해 들녘에 나가 나물을
캐고 봄쑥이며 냉이 씀바귀 나물무침이며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뚝배기에 된장국을 끓이고 불을 때어 저녁밥
을 짓고 아! 그런 다소곳하고도 아미 고운 조선색시
다시는 없겠지요.
가르마 같은 논밭길을 걸어오며 모락모락 멀리 밥짓는
저녁 연기 바라보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씻은 듯
털어내며 가슴 뿌듯한 행복으로 발걸음 재촉하는 그런
그런 눈매 선한 조선 사내도 다시는 다시는 없겠지요.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1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434
-
Subject: 꿈같은 꿈같은 2
Tracked from
2007/06/04 11:15
새벽길님의 [박남준의 시 세 편] 에 관련된 글. 박남준 님의 시는 정말 그런 탄사가 절로 나오는 시이긴 합니다. 새벽길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정화한 성별 분업과 섹슈얼한 이미지를 활용해 시어로 만들어 시작하는 경우의 시가 왕왕 있기는 하지요. 그런 시인들이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가끔 서점 시 코너에 죽 때리고 앉아 읽다보면 별안간 쏟아지기도 하고요. 무척 고민이 드는 것은 그런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Twitter
Twitter Facebook
Facebook Flickr
Flickr RSS
R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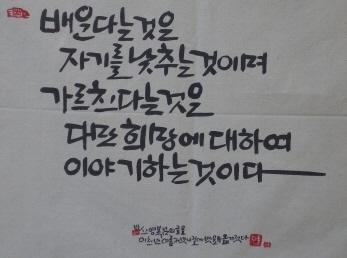
 back to top
back to top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