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의 두번째 소설집을 읽다
김영하 소설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과지성사. 1999.
헌책방에 갔을 때 찾아보는 소설이 있다면 김영하와 성석제의 소설이다.
사실 김영하는 최근 조선닷컴에서 연재소설 '퀴즈 쇼'이 연재된 것을 발견하게 된 후 실망하게 되었지만, 이미 사놓은 책이니 읽어보는 것이다.
이 소설집은 호출에 이은 김영하의 두번째 소설집이고, 내가 읽은 두번째 소설집이다. 호출을 읽었을 때보다는 감흥이 조금 덜하다. 그래서인지 작가 후기에서 김영하는 두번째 소설집을 묶는 지금, 좀더 독해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피력한다. 그가 말하는 담배 같은 소설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담배 같은 소설을 쓰고 싶었다. 유독하고 매캐한, 조금은 중독성이 있는, 읽는 자들의 기관지로 빨려들어가 그들의 기도와 폐와 뇌에 들어붙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며 다소는 몽롱하게 만든 후, 탈색된 채로 뱉어져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기를, 나는 바랐다. (285쪽)
첫번째 나오는 “사진관 살인 사건”은 예상한대로 전개된다. 사진관 살인 사건이 영화 '주홍글씨'의 모티브가 되었다던가. 갑자기 한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이은주가 생각난다.
"흡혈귀"에 나오는 흡혈귀는 내가 꿈꾸었던 이라고 해야 하나. 흡혈귀 옆지기의 사정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흡혈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섹스보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좋다. 이게 영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세상의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누군가를 안고 있으면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다도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벌레라도 상관없다. 지금의 내 몸을 나는 증오한다." (67쪽)
위의 말은 흡혈귀로 여겨지는 주인공의 말이다. 한마디로 배부른 투정이라고나 할까. 세상에는 지나침보다는 부족함으로 인해 절망하는 이들이 많다. 나는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니면 둘다 아닐까.
"바람이 분다"에 나오는 만남이 누구에게나 가능할까. 나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살기도 어렵고, 갑작스레 훌쩍 떠나지도 못한다. 이런 나에게도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소설의 '나'는 현실의 나와도 비슷하긴 한데 나는 '나'만큼 뭔가 '저지르지'는 못한다. 범생이라서 그런가.
소설에서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결근하자 '나'는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을 떠올린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증오하며, 그 사람을 증오하는 자신을 증오하며, 증오하면서도 증오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실없음을 증오하며 나는 아주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83쪽)
하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다. 내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할 때가 많은데, 그는 전혀 이런 맘을 모른다. 이심전심은 이럴 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음식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일에는 감정이, 때로는 감상이 개입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건 연인이나 가족이 하는 일이다. (85쪽)
나는 이런 감정이 생길까봐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나 보다. 아마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별 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런 CD가 좋다. LP의 추억 따위를 읊조리는 인간들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LP의 음은 따뜻했다고, 바늘이 먼지를 긁을 때마다 내는 잡음이 정겨웠다고 말하는 인간들 말이다. 그런 이들은 잡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잡음에 묻어 있을 자신의 추억을 사랑하는 것이고, 추억을 사랑하는 자들은 추억이 없는 자들에 대해 폭력적이다. (86쪽)
OK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에 나온 것처럼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어쩐지 모든 일이 뒤틀려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하루종일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하나씩 하나씩 찾아온다.' (101쪽)
그런 날은 자신의 얘기를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해주어도 모두 귀찮아하고, 나도 말하는 게 조리가 없어진다.
엘리베이터에 한 여자와 갇혀지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역시 주인공처럼 당황해하다가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길 듯하다.
“피뢰침”은 벼락을 맞아본 사람들의 모임을 소재로 했다. 그런 모임이 있을까. 벼락을 맞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안 것이다. 벼락을 맞는 희열이 가능한가. 나는 두려워서도 그리 못할 것 같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한번쯤 잊지 못할 경험을 한다. 문제는 그 경험이 아주 짧고 강렬했을 때 발생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디테일들은 부정확해지고 나중엔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나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잊지 못할 일을 이야기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곤 한다. 한번 언어로 만들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보통 다소의 윤색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 경우는 조금 달랐다. 그 짧고 강렬한 순간이 지나가고 난 후, 까닭 없이 죄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125쪽)
내 경우는 전자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서로 남긴다. 그 문서도 다소 윤색된다. 엄밀한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문서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비상구"의 '나'와 같은 삶은 상상할 수는 있으나,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 나는 스무 살 때 뭘했을까나. 여기에 나와 있는 소설들은 이전 소설집 '호출'의 상황보다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리얼리즘의 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해설에서 백지연이 말했듯이, '"비상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희망이 거세된 세계가 보여주는 인생의 아이러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에 동감한다.
내 나이도 올 겨울만 지나면 스물하나가 된다. 오토바이 타고 장난칠 때도 지났고 삐끼질 할 짬밥도 아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허리 굽히고 살기도 싫다. 집구석으로 들어가는 건 더 좆같다. 집에 가봐야 눈칫밥밖에 더 먹나. 괜찮은 년 하나 있으면 살림 차리고 씨팔, 이삿짐이라도 날라볼까. 하루 일당 십만 원이면 뺑이야 치지만 삐끼보다는 낫다. (172쪽)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과 "당신의 나무"는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다. 그래서 따로 할 얘기도 없긴 하나, 아래 구절이 인상적이라서 옮겨온다.
세상 어디는 그렇지 않은가. 모든 사물의 틈새에는 그것을 부술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네. 지금은 이런 모습이 이곳 타 프롬 사원에만 남아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밀림에서 뻗어나온 나무들이 앙코르의 모든 사원을 뒤덮고 있었지. 바람이 휭 하니 불어와 승려의 장삼을 펄럭였고 당신의 땀을 증발시켰다. 승려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그때까지 나무는 두 가지 일을 했다네. 하나는 뿌리로 불상과 사원을 부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그 뿌리로 사원과 불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일이라네. 그렇게 나무와 부처가 서로 얽혀 9백 년을 견뎠다네. 여기 돌은 부서지기 쉬운 사암이어서 이 나무들이 아니었다면 벌써 흙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 사람살이가 다 그렇지 않은가. (261쪽)
"고압선"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자 사라지게 되는, 투명인간이 되는 색다른 얘기를 다룬다. 투명인간이 된다는 설정만 다를 뿐,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나에 관한 것이다. 지금의 나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닐지...
 Twitter
Twitter Facebook
Facebook Flickr
Flickr RSS
R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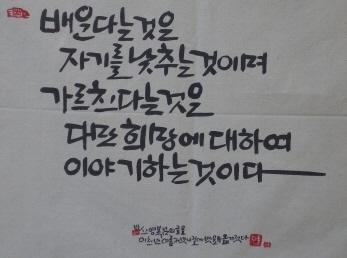
 back to top
back to top
Recent Comments